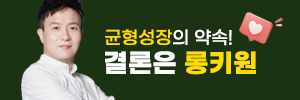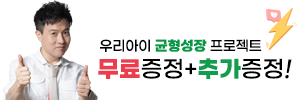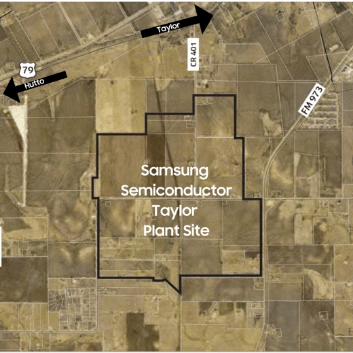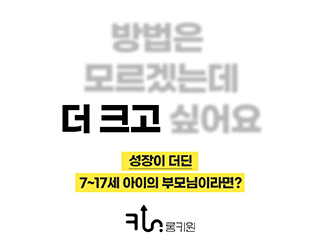|
| ▲신재창/ 싱어송라이터 |
어릴 때 한 시간을 걸어야 닿는 학교에 다녔다. 유치원부터 매일 꼬박 두 시간을 통학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멀리 면사무소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다녀야 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막차로 돌아오는 길은 멀기도 멀지만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정말 괴로웠다. 비바람에 바지는 젖고 춥고 배고픈데 길은 끝이 없고... 지금 생각하면 모두 추억이지만 당시엔 얼마나 절실했는지 그런 날이면 언덕위에 볕이 잘 드는 사방이 유리로 지어진 따뜻한 집을 상상하곤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리 폭풍우 눈보라가 몰아쳐도 집에 가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끔찍한 날도 일단 길을 나서면 어느 순간 집에 도착해 있었다.
첫발을 떼는 순간 마지막 결승점은 한발씩 다가오는 것이니 과정이 힘들어도 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아무리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겨울이야 곧 지나가겠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이 전 세계적 전염병이 주는 공포는 그것과 사뭇 다르다.
특히 공연이 주업인 나 같은 사람들에겐 그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문 강에 삽을 씻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등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정희성 시인의 시이다. 신경림 시인은 이 시에 대하여 『시인을 찾아서』 두 번째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유신의 어둠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다.
언제 봄이 올지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허망한 마음을 노래했다... 중략”. 계절의 봄은 이미 왔으나 나라는 아직 시퍼런 유신독재의 칼날 아래 있으니 당시 시대를 고민하고 아파하던 지식인으로서 어찌 괴롭지 않았으랴. 민주화의 봄은 멀고먼데 시절은 한량없이 오고 또 가니 얼마나 야속한 일인가.
또한 일제 강점기를 온몸으로 저항했던 이육사 시인은 “절정”에서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했다.
‘매운 계절의 채찍’으로 극한 상황―가혹한 추위가 지배하는 일제 강점기―에 내몰렸지만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참된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시인의 의지와 희망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절대로 끝나지 않을 듯 보였던 강철 같은 겨울도 물러가고 독재도 끝이 났다. 각 35년, 19년 만의 일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강철을 마주하고 있다. 예고도 선전포고도 없이 들이닥친 얼굴도 형체도 없는 이 겨울은 지난 일 년 동안 세계를 마비시켰다.
그것도 시시각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말이다.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 끝에 한숨이 부쩍 많다. 아니 실은 내가 그렇다. 공연이 생계고 생계가 곧 공연인 나 같은 가수들은 공연 자체가 안 되니 살 길이 막막하다. 다행히 시를 노래하면서 시인들 사이에 이름이 좀 알려진 덕분에 들어오는 작곡 의뢰로 네 식구가 간신히 산다.
이 땅에서 무명의 음악인으로 산다는 일은 가난을 친구 삼아 살아야 함을 일찌감치 예견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참으로 황망하다. 하지만 이십 년을 버텨온 구력이 앞으로의 이십 년을 견인할 것을 믿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음을 안다. 가슴속에 폐허 하나쯤 더 늘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랴. 오늘도 간간이 하나마나 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하루가 진다. 간절한 생의生意 앞에 겨울도 죽음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함을 믿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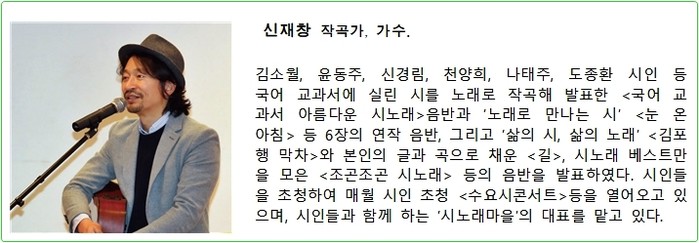
[저작권자ⓒ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